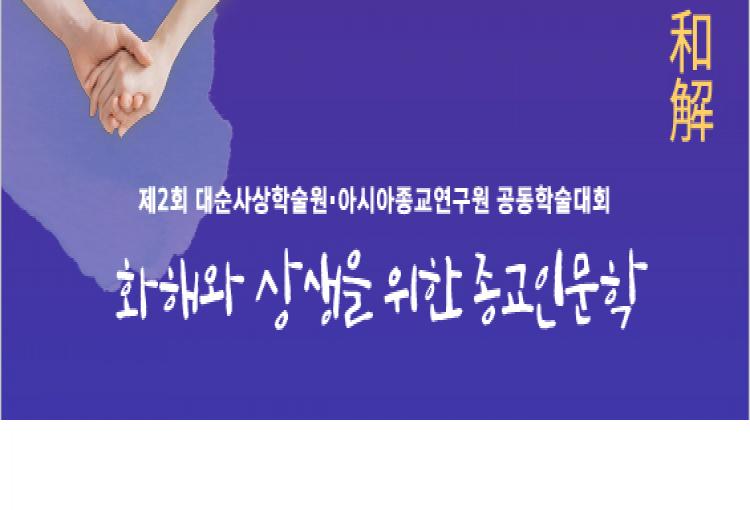증산의 언설로 보는 가짜뉴스
I. 머리말
우리는 24시간 뉴스가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만 매일 생산되는 뉴스가 평균 6만여 건이 넘는다는 통계1) 도 있고, 선거철이나 태풍이 온다거나 월드컵과 같은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분야의 뉴스만 백만 건 이상 유통되기도 한다. 이 처럼 엄청난 양의 뉴스는 누가 만들어낼까? 신문, 방송 등 레거시 미디어(legacy media)2)는 물론이고 1인 유튜버, 인터넷 커뮤니티, 인터넷 카페,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첨단 매체의 보급으로 확장된 SNS(소셜 미디어)와 같은 뉴미디어에 거의 무한대의 뉴스가 돌아다닌다. 그러다 보니 매체간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조회수가 곧 ‘돈’ 인 세상이기에 클릭을 유도하는 선정적인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가짜뉴스에는 ‘알고 보니 마이클 잭슨이 외계인이었다더라’와 같이 실소를 자아내는 오락용 뉴스도 있지만, 생명을 위협하고, 멀쩡한 회사를 도산으로 몰기도 하며, 심지어 한 국가의 존망(存亡)을 결정할 정도의 부정적 파급력을 갖는 것도 부지기수이다.
거짓되고 왜곡된 소문이나 뉴스 기사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 시대에 더 많이, 더 빨리 유통되는 측면이 있으나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짜뉴스의 예는 무수히 많다. 기원전 33년 로마황제 옥타비아누스는 정적 안토니우스를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정치조직을 동원하여 안토니우스가 원로원의 동의 없이 로마의 속국들을 불법적으로 분할했다는 주장, 정실부인을 내쫓고 클레오파트라를 정식 아내로 맞이하고 괴상한 복장을 한 채 술에 취하여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시정잡배들과 어울린다는 설, 클레오파트라는 흑마술을 쓰는 마녀라는 설과 같이 터무니없거나 과장된 소문을 유포했다. 결국 로마 시민들은 안토니우스를 여자에 빠져 로마를 저버린 배신자로 여기게 되었고, 중립적인 인 사들까지 옥타비아누스의 편에 서면서 전쟁은 옥타비아누스의 승리로 막을 내리며 로마의 운명을 결정짓게 된다. 악티움해전으로 명명된 이 내전은 어쩌면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가 난무하는 최초의 탈근대적인 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다.3)
신의 권능에 대한 절대적 복종이 미덕이었던 중세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아서 마녀사냥이라 불리는 배타적이며 악의적 선동으로 인해 수 많은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지금도 별다른 근거 없이 특정인에 게 죄를 뒤집어씌워 무차별 공격을 하는 현상을 가리켜 ‘마녀사냥’이라 부를 정도로, 가짜뉴스에 속아 잘잘못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덮어놓고 비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전경]에도 부자라는 헛소문 때문에 도적 떼에 피해를 입을까 두려움에 떠는 종도 김보경을 증산이 덕화로써 지켜주신 이야기4)가 있으며, 심지어 증산 자신도 사술을 행한다는 헛소문에 관가에 고발 당하기 직전 아슬아슬하게 벗어나셨다는 일화가 나온다.5) 이 밖에 진정성 있는 말은 천지도 부수지 못할 것이지만 허위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가르침은 진짜와 가짜는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진리를 일깨워 준다.6) 또한 정산도 현란한 언사로써 혹세무민하는 행동은 천지 안에서 용납할 길이 없다는 말로 종도 들을 경계하신 바 있다.7) 이 모든 언행은 시대와 맥락은 달랐지만 증산과 정산 두 분 모두 참과 거짓의 갈래를 확실하게 밝혀주셨다는 공통점이 있다.
가짜뉴스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 ‘진실’을 좇는 길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가짜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증산의 언설을 통해 그 해악성을 설명해 보려고 한다. 또한 진실을 찾기 위한 수도인의 자세와 수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도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가짜뉴스의 개념 및 확산 과정
가짜라고 해서 모두 해악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동물의 털 대신 인조털(fake fur)로 만든 옷을 입거나 낚싯바늘에 가짜 미끼를 사용하는 것은 그나마 생태 보호라는 정의(正義)를 내세울 수 있으며 죽음을 앞둔 환자의 기운을 북돋아 주기 위한 의료진의 ‘하얀 거짓말’ 같은 것은 필요 불가결한 ‘가짜’일 것이다. 과거 일부 보도 매체에서 만우절에 으레 장난으로 올렸던 가짜뉴스들 역시 일 년에 하루만큼은 웃고 가자는 해학(諧謔)일 뿐 대중을 호도하고 공동체를 위협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예전에는 방송이나 신문에 보도되었다는 이유 하나로 뉴스의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오랜 역사를 지닌 지상파 방송이나 정론지라 자랑하는 신문사가 보도하는 뉴스도 진위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만우절 가짜뉴스처럼 한번 유쾌하게 웃어넘기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하며 악의적인 가짜뉴스들은 최첨단 기술을 등에 업고 교묘하게 대중을 확증 편향에 빠지게 만들어 사상과 행동을 통제한다. 정론이라는 이름으로 배포되는 이런 뉴스뿐만 아니라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시사만평이나 선정적이며 과장된 황색저널리즘(yellow journalism), 신빙성 없고 출처가 불분명한 저질뉴스인 정크뉴스(junk news), 특정한 주장이나 이념을 강조하기 위해 객관성보다는 목적성을 띠는 프로파간다(propaganda),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 광고, 조작된 여론조사와 통계, AI로 만들어진 딥페이크(deepfake), 조작된 댓글 등 언제든지 대중을 선동하고 오도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 그렇다면 과거와 달리 훨씬 악랄하게, 은밀하게 누군가의 악의를 반영하며 미디어 플랫폼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의 가짜뉴스는 좀 더 면밀하고 폭넓게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짜뉴스의 특징을 보면, 당연하게도 ‘진리’와 ‘진실성’이 부재하다.
다시 말해, 일부 또는 전체 뉴스의 내용에 속임수가 있거나 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전파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16년 독일에서 ‘리사’ 라는 이름의 13세 소녀가 사라졌을 때 러시아의 한 뉴스 매체는 그녀가 난민에 의해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보도 했다.8) 이 뉴스는 소녀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한동안 퍼져 나갔다. 이는 소녀의 실종이라는 진실 위에 난민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의도를 덧입힌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규정할 수 있겠다.
“가짜뉴스는 부정확하거나 거짓된 정보를 포함하지만 해당 정보의 부정확성을 보고하지 않는 뉴스 메시지를 나타낸다.”9)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보도 매체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에 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보도 매체가 해당 뉴스가 고의로 부정확한 내용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가짜뉴스의 고의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뿐더러 예로든 러시아 매체의 가짜뉴스로 인해 어떤 난민이 혐오 범죄를 당한다 해도 매체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 가짜뉴스 매체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뉴스의 편집 규범과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갖추지 않는 경우라도 대중의 알 권리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 또는 언론의 자유를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설령, 가짜뉴스의 피해자 측이 고발이나 고소를 한다 해도 위법성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알 권리를 내세워 조각 사유(阻却事由)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이다. 또 한가지 딜레마는 가짜뉴스를 보도하는 모든 매체가 목적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일부는 실수로, 또는 의도치 않게 가짜뉴스가 배포되기도 한다.
가짜뉴스가 만들어지는 가장 큰 동기는 금전적 이익을 노리거나 전술한 바처럼 난민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등의 ‘특정’ 이념을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근대시대에 들어서면, 인쇄술의 발달로, 가짜뉴스 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신문과 같은 활자 매체에 기사화되면서, 식자층10)도 가짜뉴스에 쉽게 노출되게 되었고, 유통 속도도 빨라졌다. 1890년대 미국의 라이벌 신문사 사주였던 조셉 퓰 리처11)와 윌리엄 허스트12)는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선정적으로 보도 하면서 독자를 놓고 경쟁했는데, 이것이 바로 ‘옐로우 저널리즘(황색 언론)’의 시작이다.13) 저널리즘의 진실성 결여에 대한 반발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황색 언론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충격적이고 과장된 뉴스 헤드라인이 주목을 끌고 신문 판매(또는 마우스 클릭)를 유도하여 광고 수입을 늘리기 때문이다. 활자화된 가짜뉴스의 시작을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규정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훨씬 더 많은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누가 ‘가짜뉴스’를 시작했는지에 관계없이 빛의 속도로 유통되는 현대적 형태의 가짜뉴스는 그 속도와 영향력의 크기가 20세기 초반의 전통적인 언론 매체와는 차원이 다르다. 지금의 가짜뉴스에는 전통적인 가짜뉴스에서 보이는 고의적으로 과장되거나 믿기 어려운 허위 보도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 바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사실 보도를 기반으로 하여 마치 진짜처럼 치밀하게 전개되고 짜깁기 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주 높은 확률로, 대의를 추구하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가짜뉴스의 타겟이 되어 하루아침에 ‘공공의 적’으로 전락해 버리기도 한다. 이제 가짜뉴스는 사상누각이 아니라 단단한 토 대 위에 누각을 짓는 것과 유사하다. 물론 누각의 자재는 불량하고 규격에 어긋날지언정 그만큼 가짜뉴스를 걸러내기도 어려울뿐더러 얼핏 보면 구성과 스토리라인이 견고하기까지 하여 그 거짓의 아성을 무너뜨리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한 가지 비극적인 예를 들자면, 원래 파키스탄의 아동 유괴를 경계하기 위한 공익 광고의 일부였던 동영상이 2018년 진짜 납치처럼 보이도록 편집되어 입소문을 타며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으로 이어진 사례를 들 수 있다.14) 2007년 미국에서는 MMR(Measles, Mumps and Rubella, 즉 홍역, 볼거리, 풍진)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거짓 주장에 대한 언론 보도가 예기치 않게 급증하여 이에 오도된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예방 접종을 거부하면서 홍역 발생 사례가 속출 하였다.15) 2020년 코로나(COVID-19) 대유행이 시작된 직후부터 많은 허위 정보와 부정확한 뉴스가 온라인에 퍼져 나가면서 혼란을 부추겼는데, 트럼프 대통령까지 합세해 인체에 치명적인 소독제가 코로나 예방에 도움이 된다거나 코로나 음모론 등을 주장하면서 미국은 가짜뉴스의 최대 생산지가 되었다. 그 결과, 미국인들은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1억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최초의 국가”16)라는 처참한 방역 성적표를 받아 들게 되었다.
이처럼 권력을 도구화하는 사악한 정치와 가짜뉴스는 불가분의 관계 이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서 단테는 권력을 남용하여 악을 합리화하고 많은 이들을 혼란과 무질서에 빠뜨려 사후 지옥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되는 자들을 목도한다.17) 중세 기독교의 죽음관을 통해 사악한 권력자는 사후세계에서조차 결코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금도 어떤 정치세력은 부정적인 영향은 감춘 채 의료서비스나 국가기관의 민영화18)를 경영 선진화, 운영 정상화, 민간위탁, 시장개방, 독점체제 개선 등으로 포장하며, 의원내각제19)를 책임총리제, 이원집정부제, 혼합정부, 분권형 대통령제, 연립정부, 거국중립내각, 국무총리 국회 복수추천제 등의 용어로 대체하면서 본질을 가리고 호도한다.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라면 정확하게 인식하기 쉽지 않도록 일부러 진실을 뒤트는 것이다. 한편, 속이는 행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종종 정책적 무능은 ‘유능’한 것처럼 전환되기도 한다.
오바마정부(2009. 01~2017. 01)와 바이든정부(2021. 01~)는 대북정책을 ‘전략적 인내(a policy of strategic patience)’20)라고 명명한, 마치 대북 맞춤 전략이라도 있는 듯 홍보하였으나 본질적으로 이런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북한이 오히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개발을 지속하도록 방조했다는 비판이 대두되었다.21)22) 역설적으로 당사국인 우리나라 국민 절대다수가 여전히 오바마나 바이든과 같은 미국 대통령들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전통적인 우방’이라는 견고한 대미(對美) 신뢰와 더불어 이와 같은 ‘프로파간다’와 ‘정확한 정보의 차단’에 기인한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무능과 거짓의 정치는 우리나라라고 예외가 아니다. 2017년 ‘재조산하(再造山河)’23)라는 기치를 내걸고 탄생한 정부는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를 얻음으로써 행정부, 지방 권력, 국회까지 순차적으로 장악하였다. 이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비폭력 촛불민중혁명의 열망이 고스란히 투영된 선거 결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어떠한 개혁과제에도 손대지 않은채 천재 일우의 기회를 허비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때나 지금이나 ‘당연히’ 책임지는 사람도, 반성도, 성찰도 없다. 오히려 여전히 당시 정부의 인사들이 마치 ‘성공한 정부’였던 것처럼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미화하고 있는 현실은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층의 ‘거짓과 허위’가 지속적으로 국가 전체에 얼마나 큰 해를 끼칠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지금은 “아무리 현자의 명함을 들고 활보한다해도 어리석은 자의 본모습은 황제의 옷을 입은 원숭이나 사자 가죽을 뒤집어쓴 당나 귀처럼 금세 본색이 들통이 난다”24)는 에라스무스의 주장에 동조하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하고 엄혹한 시대이다. 과연 우리는 거짓된 자의 본모습을 바로 볼 수 있을 만큼 통찰력이 있는가?
2024년 총선에서 보듯이 전(前) 정부의 ‘그들’ 중 한 사람은 기득권의 그럴듯한 아바타가 되어 약자들의 마지막 수단과 다름없는 ‘고난의 서사’, ‘대중의 연민’과 ‘개혁의제’까지 빼앗아 들고 급조한 신당의 대표로 화려하게 부활하였다. 겉으로는 개혁을 외치고는 있지만 그의 삶에서 공익을 추구한 흔적은 사실상 보이지 않는데도 말이다. 불과 몇 년 전 그와 그의 가족을 벼랑 끝으로 내몰며 맹폭을 퍼붓던 언론들이 지금은 멋들어지게 보정한 그의 사진과 기사로 거의 매일 뉴스를 도배하다시피 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또한 2022년 대선 당시 젠더갈등을 부추기며 여성가족부 폐지까지 공약했던 어떤 젊은 정치인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페미니스트 국회의원과 손을 맞잡았다. 극렬페미와 안티페미의 조합이라는 ‘키메라 (Chimera)’에게서 정치적 신념이나 진정성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처럼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사악한 권력자의 세 치 혀는 가장 위험한 가짜뉴스의 화수분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왜냐하면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의 거짓말은 매우 교묘하고 확장성도 커서 더 많은 사람이 더 쉽게 속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에 미치는 해악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이다.
가짜뉴스의 또 다른 해로움은 폭력을 양산한다는 점이다. 이를 방증하듯, 기득권을 옹호하며 정치적 의도에 의해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이용하는 극우 정권이 출현할 때 폭력과 살인(자살 및 타살)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다. 사회적 불공평이 심화되면 취약계층은 수치심(羞恥, shame)과 죄책감(guilt)에 빠지게 된다. 그 결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지 못한 채 사회의 음지로 내몰리면서 자신에 대한 폭력(자살)이나 타인에 대한 폭력으로 심리적 탈출구를 찾는다는 것이다.25) 또 다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신나치주의나 지하드(jihad), 또는 백인우월주의를 표방하는 극단주의적 단체에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남성들은 공통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박탈감을 내재화하며 ‘실패한 남성’이라는 사회적 낙인에 따라오는 수치(羞恥)의 강도를 줄이고 남성성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 돌이켜보면, 가짜뉴스가 극에 달했던 트럼프시대에 왜 인종혐오범죄를 비롯한 소위 지지층들의 폭력 시위가 난무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 하겠다.
이렇게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는 가짜뉴스를 번개처럼 퍼 나르는 것이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이다. 이들 뉴미디어는 가짜뉴스에 더 쉽게 빠지도록 하는 속성이 있다.
첫째, 소셜 미디어는 출처에 구애받지 않는 뉴스의 수집기 역할을 한다. 즉, 원본 소스의 품질, 신뢰성 또는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다양한 매체에서 뉴스 기사를 수집하고 제공한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이런 뉴스들은 선동가나 조작자, 아니면 단순 채택자(unit)27)든 누구든 접근하기 용이하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가짜 뉴스는 키워드 몇 개만으로도 너무나 손쉽게 제작되며 뉴스의 품질은 실제 사람이 작성한 것보다도 더 정교해지고 있다. 독자가 기사를 작성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사람을 쉽게 식별할 수 없다면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기사의 정직성을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둘째, 많은 뉴스 기사는 공유, 좋아요, 또는 리트윗과 같은 암묵적 또는 명시적 지지와 함께 친구나 팔로우하는 사람을 통해 소셜 미디어에서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이러한 암묵적인 권장 사항은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받아들이도록 독려한다. 소위 소셜 미디어는 ‘관종’이라 불리기를 즐기는 수많은 채택자를 양산한다. 앱에서는 많은 메시지가 그룹으로 공유되지만 전달될 때 출처 표시는 거의 없다. 가짜뉴스는 종종 가족과 친구들에게서 나온 ‘전언(傳言)’으로 간주되면서 누구도 사회적 책임은 지지 않은 채 무차별 유포될 뿐이다.
세 번째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자동으로 기사에 인기도(조회수 또는 좋아요 수, 인기 지표를 체계적으로 부풀릴 수 있는 매크로와 같은 온라인 조작에 의해 더욱 복잡해짐)를 표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조회수를 늘리고 싶어서 ‘조작’의 유혹을 받기도 한다. 이른바 ‘주작’28)의 탄생이다. 이와 같은 특성이 함께 작동하여 소셜 미디어 사용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짜뉴스를 공유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뉴스 기사가 온라인 네트워크 내에서 공유되면 원본 작성자나 출처, 의도 또는 목표와 같은 중요한 맥락은 제거되는데, 그 결과, 기사가 독자에 도달할 때는 원래 형식이나 내용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어떤 기사의 중요한 맥락이 손실되면서 가짜뉴스가 소셜 네트워크에서 눈 깜짝할 새 확산되는 것이다.
Ⅲ. 뉴스 바로 보기
가짜뉴스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는 정치적 이점, 타인에 대한 위해(危害),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 단순 실수나 오해 등 다양하지만 모두 ‘악의’나 부조리(不條理)29)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모든 부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가 사회적 양극화, 정보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민주적 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잠식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비교적 무해한 것에서부터 심각한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유발하는 것까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통합을 방해한다.
경쟁과 필터링을 통해 전문적인 방식으로 보도된 뉴스 소스에 의존하지 않고 너무 많은 뉴스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는 세상에서 가짜뉴스가 늘어나면 진짜 뉴스는 줄어든다. 반대로, 진짜 뉴스를 가짜뉴스라 우기는 일도 다반사다. 우리는 과거부터 이것이 가져온 끔찍한 결과를 보았고 우리의 가장 큰 도전은 이 거대한 밀물에 맞서 싸울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 시작은 ‘내’가 무심코 누른 가짜뉴스가 누군가에게는 비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을 깨닫고, 통찰과 각성을 통해 스스로의 식견을 높여 진실의 편에 서는 데서 출발한다.
[전경]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일찍이 동아시아 전통사회에서 지인 지감(知人之鑑)30)이라 하여 ‘사람을 잘 알아보는 식견’을 매우 중요한 능력 중 하나로 보았다. 고대 철학자들이 갖추어야 할 미덕으로 여긴 프루덴티아(prudentia) 역시 훌륭한 식견을 가지고 모든 사안을 사려 깊게 생각해 사리를 분별하고 과정과 결과를 살펴 미래를 대처하는 능력이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식견을 갖춘다는 것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판단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악(惡)이 일상적으로 만연하는 가운데, 어떻게 통찰력을 기르고 가짜와 진짜 정보를 분별하는 능력을 계발할 수 있을까?
다음은 지식, 기술, 비판적 사고의 조합을 통해 가짜뉴스를 거르기 위한 기초적 방식을 소개한다.
① 정보 습득 :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다. 지식을 열심히 습득하고 시사, 사회 문제 및 트렌드에 대해 최신 정보를 파악한다. 신뢰할 수 있는 소스에서 뉴스 기사를 정기적으로 읽고 신뢰할 수 있는 저널리스트를 팔로우하며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토론에 참여한다. 많은 정보를 알면, 일관성이 없거나 거짓 정보를 식별하는 안목을 갖출 수 있다.
② 미디어풍경(mediascape)31)과 편향성 이해 : 미디어풍경, 다양한 뉴스 매체, 그들의 편집 방침 및 잠재적 편향성에 대해 알아야 한다. 편향성은 사실을 선택적으로 제시하거나 정보를 왜곡하거나 관련된 맥락을 생략할 수 있다. 보도의 편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양한 시각을 찾아본다. 다시 말해, 보다 포괄적으로 사안을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③ 비판적 사고 :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정보를 의심하고, 증거로서 평가하며, 주장을 분석하는 비판적 사고를 갖추어야 한다. 뉴스의 논리적 오류를 인식하고, 인신공격이나 분노, 불안, 슬픔, 연민과 같은 강력한 감정에 어필하는 것과 같은 ‘숨은 의도’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깊이 있는 질문을 하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계몽 (self-enlightenment)한다. 누구나 일정 수준의 교육자본을 갖추고 있 는 현시대에 ‘계몽’의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 자신이 우선순위이어야 한다.
④ 정보 검증 : 사실 확인 및 검증 기술을 연마한다. 신뢰할 수 있는 소스에서 정보를 교차 참조하여 정확성을 확인하고 하나의 소스에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⑤ 신뢰성 평가 : 가능하다면 뉴스 소스와 저자의 신뢰성을 평가해 본다. 미디어는 공공재이며, 저널리스트는 신뢰성을 담보로 기사를 작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기레기’32)라는 별칭이 난무하는 오염된 저널리즘의 세계에서, 정확한 보도 기록이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생산자인지는 잠깐의 인터넷 검색으로도 바로 알아낼 수 있다. 다행히 그만큼 가짜뉴스에 대항하는 깨어 있는 시민들의 활동도 활발하기 때 문이다.
⑥ 심층 기사와 탐사 보도 구독 : 심층 기사와 탐사 보도는 종종 복잡한 문제에 대한 심오하고 포괄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사들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연구, 취재, 인터뷰 및 사실 검증을 포함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출처로써 신빙성을 높인다. 탐사 보도는 배경 정보가 부재한 뉴스 단신의 심층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소위 ‘제목 장사’라 하여 선정적인 기사 제목으로 일단 눈길을 끈 다음 상이한 내용의 기사로 독자들을 호도하는 ‘사악한’ 뉴스를 걸러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⑦ 마지막으로, 누구도 가짜뉴스의 폐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현실을 직시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연구조사를 보면, 진짜와 가짜가 뒤섞인 뉴스에서 가짜를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부재하다.33) 누구라도, 언제든지 가짜뉴스에 속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가짜뉴스에 속은 사례를 되돌아보고 배움의 기회로 삼는다. 가짜뉴스에 속은 이유를 분석하고 미래에 비슷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전략을 찾고, 경우에 따라 자신의 신념을 수정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헤겔(George Wilhelm Friedrich Hegel)은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녘에야 날개를 편다’고 했다. 이는 부엉이가 날아오르는 황혼 무렵에야 존재했던 모든 것을 되돌아보면서 마침내 그 빛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즉, 성찰과 회심(廻心)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통과 의례와 다르지 않다.
위에서 말한 제안들은 뉴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스스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도일뿐 사실 가짜뉴스를 완벽히 알아보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적어도 공적인 차원에서 가짜뉴스를 생성하는 언론이나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한 예로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언론자유의 위축을 빌미로 민사법적 논의 30여 년 만 인 2021년에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언론중 재법)34)이 개정되었으나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 상한선을 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보도에 대해서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을 규정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2023년 미 국의 Fox News가 2020년 대통령 선거캠페인 당시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소송에서 7억 8,750만 달러(약 1조 934억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35)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언론중재법’은 실질적 효력이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법으로 인한 이익이 나중에 혹시 받게 될지 모르는 처벌보다 크다면 악의적 뉴스,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는 거의 별다른 견제도 받지 않은 채 ‘언론의 자유’라는 그럴듯한 명분하에 지속적으로 자행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과 별개로 언론의 방종, 나아가 대중의 신뢰를 이용한 악의적 뉴스 유포에 대해서 분명하게 법적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다.
Ⅳ. 맺음말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는 악(惡)이 일상적으로 만연해 있다. 가히 난법난도(亂法亂道)의 시대, 금수대도술(禽獸大道術)의 난세와 다르지 않다. 과거에는 어떤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폭력과 패륜적 범죄가 하루도 빠짐없이 뉴스를 탄다. 이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흉폭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보도에 가장 흔하게 나오는 주변 반응에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평소에 착하고 모범적인 사람이다’를 비롯해 심지어 2024년 벽두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야당 대표 암살미수범에 대해서는 ‘법 없이도 살 분’36)이라는 주위의 평가까지 흘러나왔다.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범인들이 정말로 평범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어떤 강력한 동기에 찰나의 순간 사로잡히기라도 한 것인가?
우리는 구세군 자선냄비에 주저 없이 성금을 넣는 이타적인 사람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옳지 못한(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종종 간과하게 된다.37) 선함과 정의로움에서 어떤 ‘교집합’을 찾을 수 있다고 해서 이 속성들을 모두 동일시하는 것은 ‘노새’와 ‘당나귀’를 똑같다고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필연적으로 우연, 본성, 강제, 습관, 계산, 분노, 욕망이라는 일곱 가지 원인으로 무슨 일이든 행한다. 정의로운 사람이든 불의 한 사람이든 행위의 동력이 계산에 의한 것일 수도, 감정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38) 인간처럼 조작에 능한 고등 개체의 범죄 심리를 학문적으로 낱낱이 설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가 제시한 ‘악(惡)의 평범성(또는 악의 일상성, banality of evil)’은 이런 ‘착한’ 범죄자를 분석하는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렌트는 악은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에 진지한 사유를 하지 않아 나타난다고 말한다. 비근한 예로, 국가에 복종하고 상관의 명령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기에 유태인 학살을 범죄로 여기지 않았던 수많은 독일 군인들이나 1980년 5월의 광주에서 ‘북괴의 지령을 받은 불순분자’들을 진압함으로써 나라를 구한다고 생각한 계엄군의 폭력적 행위39)는 ‘도덕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악이 아니라 ‘조작된 도덕에 대한 맹목적 추구’와 ‘선동 정치’가 합작한 거악이었다. 국가 또는 기득권, 심지어 자본에 의해 공인되는 ‘범죄의 시대’에는 선악의 경계가 불분명할 수밖에 없다. 아렌트는 누구라도 악을 행할 수 있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무사유(無思惟)를 하나의 원인으로 제시한다. 한계를 넘어서는 흉악한 일이 누구를 통해서든 가능하고 ‘악’이란 말이 지칭하는, “나쁨의 크기가 우리의 평범한 삶의 일상성과 직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용어가 악의 평범성”40)이다. 이런 맥락에서 자신이 무심코 퍼뜨리는 가짜뉴스가 악의 씨앗이 되어 정론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물리적 또는 사회적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한 줄짜리 뉴스일지라도 그 파급효과에 대해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일이다.
진실을 감추거나 축소 보도로 일관하는 정치적 미디어의 영향일까? 무사유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일까? 누군가는 핵원전 폐수 방류를 드넓은 바다에 잉크 한 방울 떨구는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반면, 다른 누군가는 인류를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절멸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를 느낀다.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누군가는 ‘태평성대(太平聖代)’의 도래를 기뻐하고, 누군가는 ‘야만의 시대’의 회귀를 통탄해 마지않는다. 우리는 매일매일 가늠할 수조차 없는 이 엄청난 사고(思考)의 간극(間隙)이 엄연히 상존(常存)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모든 일을 있는 말로 만들면 아무리 천지가 부 수려고 할지라도 부수지 못할 것이고 없는 말로 꾸미면 부서질 때 여지가 없다”41)고 하신 증산의 말씀을 상기한다면, 또한 종단의 실존적 정체성인 대순진리(Truth of Great Itineration)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다면,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자명하다.
대순진리회 교리의 핵심서인 [대순진리회요람]의 「훈회」편에는 “인간의 모든 죄악의 근원은 마음을 속이는 데서 일어나는 것인즉 인성의 본질인 정직과 진실로써 일체의 죄악을 근절하라”42)는 말씀이 있으며, 수칙에서도 “양심(良心)을 속임과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언행(言行)과 비리괴려(非理乖戾, 도리에서 어그러져 합당치 않은 것)를 엄금(嚴 禁)”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조 사강령중 안심(安心)에서 진실(眞實)하고 순결(純潔)한 본연(本然)의 양심(良心)으로 돌아가서 허무(虛無)한 남의 꾀임에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한다. 또한 삼요체의 신(信) 에서도 “하나를 둘이라 않고 셋을 셋이라 않고 저것을 이것이라 않고 앞을 뒤라 안하며,” 수도의 목적인 도통의 완성을 위하여 진실을 근본으로 성심(誠心)을 다하여 수도43)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에서 보면, 인성의 본질, 즉 본성의 근원은 정직과 진실이다. 그렇다면, 악이 만연한 가운데에서도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지키고, 본성을 되찾기 위한44) 도인의 가장 근원적인 본분은 수도(修道)일 것이다.
거짓으로 날조한 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도와 같은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논의되기도 하지만 인간의 욕망이 있는 한, 앞으로도 계속 가짜뉴스는 노도(怒濤)처럼 세상을 휩쓸 것이고, 당연하게도, 우리는 각자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어쩌면 그 옛날 사마천이 경계한 “호리천리(毫釐千里)”45)가 무색할 정도로, 같은 사안에 대한 우리 안의 극과 극의 인식 차이는 영영 메울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에서 생각이 나온다”46)는, 이 ‘간결하고 명징’한 증산의 언설이 어느 때보다도 두렵고 절박하게 와 닿을 수밖에 없다. 후천개벽의 여명기인 지금, 그 누구라도 끊임없이 사유하고 수도함으로써 거짓의 미망에서 빠져나와 진실의 편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
1) 김준일, 「뉴스톱은 어떻게 팩트체크를 하나 : 각계 전문가 참여하는 팩트체킹 … 정보 넘어 지식 주는 매체로」, [신문과 방송] 578 (2019), p.72.
2) ‘레거시(legacy)’의 사전적 의미는 ‘유산(遺産)’으로 레거시 미디어는 기존의 전통적 인 매체를 뜻한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TV, 신문, 잡지 등의 기존 언론 매체를 지칭한다. 레거시 미디어가 종이와 전파 매체라면, SNS, 넷플릭스와 같은 OTT플랫폼 등의 뉴미디어는 소프트웨어와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다.
3) 전통사회에서는 문화적 차이, 권력 관계, 경제적 이익, 정치적 이념 등에 초점을 맞추어 전쟁을 수행하지만, 현대에는 단순히 군사 전략과 전술뿐만 아니라 심리전을 비롯해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다. 이런 맥락에서 ‘탈근대적 전쟁(postmodern war)’으로 기술하였다. 탈근대주의는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사상적 및 정치적 경향의 총칭으로서 전통적인 가치, 경계, 기존의 틀이나 규범과 규율을 거부하고 다양성 을 추구한다.
4) [전경] 13판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행록 3장 24절, “갑진(甲辰)년에 도적이 함열에서 성하였도다.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거니와 김 보경도 자기 집이 부자라는 헛소문에 매우 신경을 쓰고 있었느니라. 이해 九월 중순경에 상제께서 함열회 선동 김 보경의 집에 오셨도다. 보경이 「도적의 해를 입을까 염려되오니 어찌 하오 리까」고 근심하니 상제께서 웃으시며 보경의 집 문 앞에 침을 뱉으시니라. 상제께서 떠나신 후로 도적이 들지 않았도다.”
5) 같은 책, 행록 5장 11절, “원래 경학의 형은 이상한 술객이 경학을 속여 가산을 탕패케 한다는 소문을 듣고 한편으로 경학을 만류하고자 또 한편으로 그 술객을 관부 에 고발하려는 심사에서 사람을 보낸 것이니라. 그리하여 경학이 집으로 돌아오는 중도에서 순검을 만나 함께 집에 오니라. 그리고 순검은 상제를 못 찾고 최 창조의 집에 가서도 역시 찾지 못하고 있는 중에 상제께 세배하려고 최 창조의 집에 들어선 황 응종과 문 공신을 구타하였도다.”
6) 같은 책, 교운 1장 36절, “「모든 일을 있는 말로 만들면 아무리 천지가 부수려고 할지라도 부수지 못할 것이고 없는 말로 꾸미면 부서질 때 여지가 없나니라」고 말씀 하셨도다.”
7) 같은 책, 교운 2장 59절, “또 도주께서 하루는 「있는 말 없는 말을 꾸며서 남을 유 혹하지 말고 올바르게 진리를 전하라. 혹세무민하는 행동은 천지 안에서 용납할 길이 없도다」고 종도들을 깨우치셨도다.”
8) Romy Jaster and David Lanius, “What is fake news?,” Versus 2:127 (2018), pp.207-208.
9) Chif-Chien Wang, “Fake News and Related Concepts: Definitions and Recent Research Development,” Contemporary Management Research 16 (2020), pp.148-149.
10) 학식과 견문이 있는 계층. 지식인 계층으로, 다른 사람의 사고방식, 태도, 의견, 행 동 따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11) Joseph Pulitzer(1847~1911), 미국의 신문 경영인이자 언론인으로 뉴욕주 하원의 원으로 정계에 진출하기도 하였다. 그의 유언에 따라 퓰리처상이 제정되었다.
12) William Randolph Hearst(1863~1951), 미국의 언론 및 출판사 사주였던 조지 허스트의 아들로. 흥미롭고 읽기 쉬운 기사를 생산하며 신문왕 퓰리처와 경쟁하였다. 현재도 허스트일가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휴스턴 크로니클 등 유명 일간 신문 17개, 주간지 57개,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등 세계적인 구독자를 갖고 있는 잡지들, ESPN방송사, 통신사, 라디오방송사 등 거대한 언론 제국을 통해 막대한 영향 을 미치고 있다.
13) Diana Ascher, “The New Yellow Journalism: Examining the Algorithmic Turn in News Organizations’ Social Media Information Practice through the Lens of Cultural Time Orientation,” (Doctor of Philosophy in Information Studies, UCLA, 2017), pp.175-176.
14) BBC NEWS, “India WhatsApp ‘child kidnap’ rumours claim two more victims,” 2018. 6. 11.
15) Meradee Tangvatcharapong, “The Impact of Fake News: Evidence from the Anti-Vaccination Movement in the US,”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Conference (2019), pp.5-12.
16) Mary Kekatos, “US hits more than 100mil. COVID-19 cases. Experts say this is likely an undercount,”《ABC NEWS》 2022. 12. 24. 보도 참조.
17) 단테 알리기에리, [신곡 : 지옥편] ebook, 이종권 옮김 (서울: 아름다운날, 2016).
18) 민간 부문은 사람보다 이익과 투자자, 즉 자본을 제공하는 주주에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필수 산업의 민영화는 정부가 제공한 생산성, 신뢰성 또는 높은 기준을 제공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 사실상 서비스의 질은 오르지 않고 비용만 오르는 것이다.
19) 의원내각제란 다수 의석 정당이 행정부 구성권을 가지며 의회에 책임을 지는 정치 제도이다. 이념대립이 극심하고 민주주의 도입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의 경우, 의원내각제는 독일, 영국과 같은 민주국가의 제도를 따르기보다는 지역구 세습과 다선(多選) 의원들의 의석 독식, 그리고 특정 정치세력의 장기 집권이 가능한 일본식 내각제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 다수는 변함없이 직선제 대통령 중심의 정부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2023년 조사에서 국회 에 대한 신뢰도는 10년째 꼴찌에 머물고 있다(이지용, 「이러니 국회의원 못 늘리지 … 국민 4명 중 3명 ‘국회 못 믿어’」,《매일경제》2023. 3. 24. 참조). 이로 인해 기득권 정치세력은 종종 ‘의원내각제’라는 용어를 아예 감추고 다른 용어로 대체하여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려 시도한다. 뿐만아니라 끊임없이 대통령제를 ‘제왕적’이라 비판하면서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주도하며, 개헌이나 분권형 대통령제 등 을 주장하며 본질을 왜곡하기도 한다.
20) 유엔 안보리 제재 등의 경제적 압박을 지속하면서 북한이 붕괴할 때까지 기다리는 정책적 기조. 즉, 북한이 변하기를 기다리며 무시로 일관하겠다는 의미.
21) James E. Goodby and Donald Gross, “Strategic Patience Has Become Strategic Passivity,” The Brookings Institution, 2010.12.22. (https://www.brookings.ed u/articles/strategic-patience-has-become-strategic-passivity, 2024.4.28. 검색).
22) Ted Galen Carpenter, “Joe Biden Must Avoid Strategic Patience on North Korea,” Cato Institute, 2021. 1. 19. (https://www.cato.org/commentary/joe-biden -must-avoid-strategic-patience-north-korea, 2023. 4. 15. 검색).
23) 임진왜란 때 충무공 이순신이 서애 류성룡에게 적어 준 글귀로,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만들지 않으면 죽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던 충신의 마음으로 대한민국 대개 조에 절박하게 나서야 한다는 뜻.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사자성어였다.
24)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 [우신예찬], 박문재 옮김 (파주: 현대지성, 2022), p.12.
25) James Gilligan, “Shame, Guilt, and Violence,” Social Research 70:4 (2003), pp.1149-1180.
26) Michael Kimmel, “Healing from Hate: How Young Men Get Into—and Out of —Violent Extremism, 1st e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8), pp.28-39, pp.134-186. 이들 청년은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폭력이나 따돌림, 괴롭힘 등의 경험 이 있고 훨씬 힘있는 집단으로부터 지지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대부분이었다. Michael Kimmel, “Almost all violent extremists share one thing: their gender,” The Guardian, 2018.4.8. 보도 참조.
27) 새로운 문화요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개체로, 사람, 제도, 법령, 기관, 심지어 국가도 채택자가 될 수 있음.
28) 주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어떠한 것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없던 일을 있 었던 것처럼 꾸미는 것을 뜻하는 인터넷 신조어.
29) 부정행위 또는 이치에 맞지 아니하거나 도리에 어긋나는 일.
30) 조광희, 「대원종 : 하도낙서(河圖洛書)와 지인지감(知人之鑑)」, [대순회보] 229 (여 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20) 참조; [전경], 공사 1장 30절 참조.
31) 미디어풍경은 다양한 미디어 형태와 기술에 의해 조성된 전반적인 환경을 가리키는 용어로, 특정한 맥락이나 사회 내에서 미디어 플랫폼, 콘텐츠, 그리고 수용자들 간의 상호작용성을 포함한다.
32) 가짜뉴스나 수준 낮은 기사를 쓰는 기자를 비하해 부르는 속어로 ‘기자’와 ‘쓰레기’ 를 합성한 신조어이다. 2021년 대법원은 ‘기레기’라는 댓글을 썼다는 이유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기레기’가 모욕적 표현이기는 하나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해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해 표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표현도 피해자(기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사회상 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며 무죄 취지의 선고를 내린 바 있다.
33) 2017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실제 기사에서 발췌한 진짜 뉴스 문장 2개와 인터넷상에 루머 형식으로 배포된 내용에서 발췌한 가짜뉴스 문장 4개를 서로 섞어서 제시한 후 진실 및 거짓 여부에 대해 답하도록 했다. 제시한 내용은 출처의 전체 내용이 아닌, 전체 내용을 대표하는 짧은 문장으로만 구성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1,084명 중 진짜 뉴스 2개를 모두 진실로, 가짜뉴스 4개를 모두 거짓으로 응답한 사람은 1.8% 인 19명에 불과했다. 오세욱ㆍ박아란, 「일반 국민들의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 [미디어이슈] 3-3 (2017), pp.1-12.
34) 「언론중재법」에는 언론은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라도 진실하다고 믿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보도가 나오게 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 피해자의 경우 언론 보도의 고의성 여부를 증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지난한 법정 투쟁이 필요할 것이다.
35) Jeremy W. Peters and Katie Robertson, “Dominion-Fox News Trial Fox News Settles Defamation Suit for $787.5 Million, Dominion Says,” New York Times, April 18 (2023).
36) 장서윤 외, 「[단독]이웃들 “이재명 습격범, 법 없이도 살 분 … 깜짝 놀라”」,《중앙 일보》2024. 1. 2.
37) 서양 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정의’를 인간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안정된 사회를 확립하기 위한 모든 덕목 중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IEP, “Western Theories of Justice,” https://iep.utm.edu/justwest, 참조). 우리나라에서 범죄 피해자를 돕다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사례나 대부분의 내부고발자 및 공 익제보자가 처했던 현실을 상기해 보자. 정의로운 행위는 때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잃 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38)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박문재 옮김 (파주: 현대지성, 2020), p.26.
39) 당시 전두환의 신군부는 5.17 비상계엄확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북한의 남침설을 유포했으며 시민군의 저항을 고정간첩과 불순세력의 폭동이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40) 김선욱, 「근본악과 평범한 악 개념 : 악 개념의 정치철학적 지평」, [사회와 철학] 13 (2007), p.43.
41) [전경] 13판, 교운 1장 36절.
42) [대순진리회요람] (여주: 대순진리회 교무부, 2016), pp.18-19.
43)《대순종교문화연구》, 「Q&A」 (http://gyomubu.or.kr/bbs/board.php?bo_table=002 _501070&wr_id=8&page=3, 2024. 4. 29. 검색).
44) [대순진리회요람]의 취지에는 수도의 요체, 수행의 훈전을 바탕으로 인간(人間) 본래(本來)의 청정(淸淨)한 본질(本質)로 환원(還元)하여 도통에 이르는 수도의 궁극적 목적이 나와 있다. 앞의 책, pp.8-9.
45) ‘호’와 ‘리’는 자와 저울의 눈금으로 아주 작은 단위를 뜻한다. 즉, ‘호와 리를 소홀히 여기면, 나중에는 천리(千里)의 차이로 벌어진다.’라는 의미이다. 송상범, 「실지호리 차 이천리(失之毫釐 差以千里)」, [대순회보]172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5) 참조.
46) 교법 2장 53절; 김태윤, 「생각에서 생각이 나오나니라」, [대순회보] 239 (여주: 대 순진리회 출판부, 2021) 참조.